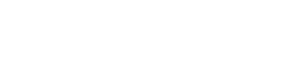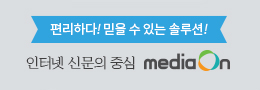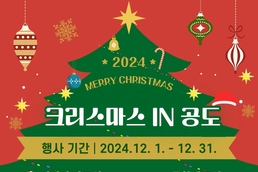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통합이 확정됐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는 22일 이사회(오전 11시) 및 총회(오후 2시)를 경기도체육회관과 이비스호텔에서 각각 열고 통합진행 경과보고와 단체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사항을 의결했다.
양 체육단체는 10월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5차례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명칭, 규정, 임원의 구성과 임기, 조직구성 및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회 종목연합회 통합종목 대상에 대해 논의했었다.
의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양 체육회는 먼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회로 결정했다. 이는 중앙 통합준비위원회가 시도통합체육회 명칭을 시도체육회로 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 자격은 정회원단체의 회장과 시군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주어지며, 통합 후,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단체, 종목연합회, 시군체육단체 통합이전까지는 (구)정가맹단체회장, (구)종목연합회장, (구)시군체육회장, (구)시군생활체육회장은 해당 단체가 통합 될 때까지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임원의 임기는 4년 중임이 가능하며, 초대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확정됐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된다. 초대 회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부회장은 6인 이내로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했다.
통합체육회의 신규조직은 현재 양 단체 직원 38명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1처 1본부 3부 9과 체제로 출범하며,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분리가 아닌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된다.
가맹경기단체-종목연합회의 통합종목 대상은 중앙의 결정사항을 따르되, 중앙과 상이한 종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종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통합을 추진키로 했으며, 시·군 체육단체 통합추진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9월부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준비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양 단체가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내 통합을 마무리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어 “통합 사무실 운영은 현재 근무지인 경기도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해 사용 할 계획이며, 기타 규정마련 등 아직 남아있는 해결 과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향후 다른 시도 체육회 통합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로 양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앞서 지난 9월 양체육회 통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진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기도체육회 추천인사 3명, 경기도 생활체육회 추천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통합 작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