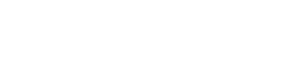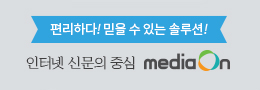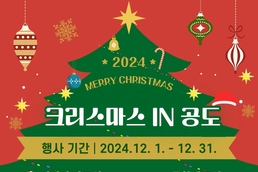7월 15일~16일 양일간 한우산업 발전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워크숍 개최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626억, 한우 명품화 사업 21억 투입
 경기도는 7월 15일(수)과 16일(목) 양일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한우산업 발전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축산업 관계자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개량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FTA 개방에 대응하고 도내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7월 15일(수)과 16일(목) 양일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한우산업 발전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축산업 관계자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개량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FTA 개방에 대응하고 도내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FTA 개방 시대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가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15일에는 이종헌 홍천 늘푸름 추진단장과 윤현상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강원지부장을 초빙해 각각 ‘한우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을 주제로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16일에는 이재혁 한국축산 컨설팅협회 소장과 서재호 농립축산식품부 서기관으로부터 각각 ‘축사시설 신축 개축 시 주요 체크사항’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요령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김현택 여주시청 주무관으로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개선효과와 사업추진상 축산농가의 유의사항’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연이어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축산 선진국과 FTA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축산대국인 뉴질랜드와의 FTA가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한우 사육두수는 올해 기준 총 6,906농가 24만5천 마리로 전국 272여만 마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17개 지자체중 6위에 해당하는 등 국내 축산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FTA 개방 이후 지난해에만 도내 한우를 사육하는 876개 농가에서 168억의 폐업지원금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318억원을 투입, 한우개량사업을 추진해 한우거세우 1등급 출현율을 2009년도 기준 56.4%에서 올해 6월 기준 86.7%로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 2009년부터 농가 910개소에 2,767억원을 투입,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사료효율 향상, 시장출하일령 단축 등 한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올해에는 한우사육기반을 확충하고 고급육 출현율을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26억여 원 투입,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21억여 원 투입 등을 추진한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한우명품화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특히, 한우보증종모우육성, 친환경축산, 축산농가 지원방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대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한우발전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