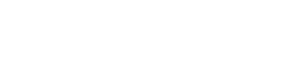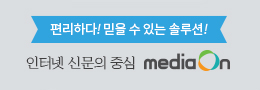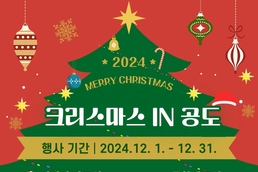농기원, 강소농민간전문가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 종합컨설팅 추진
양평군 지평면 무왕1리‘해바라기마을’로 조성
해바라기 재배로 순소득 벼농사 대비 92 %향상
여름철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연간 1천여 명 관광객 증가
마을 예술가도 참여, 각종 작품 전시회 열며 관광코스로 탈바꿈
 쓰레기 매립지로 둘러싸였던 양평군의 한 오지마을이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종합컨설팅을 받은 후 연간 1천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화제다.
쓰레기 매립지로 둘러싸였던 양평군의 한 오지마을이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종합컨설팅을 받은 후 연간 1천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양평 해바라기마을로 유명한 양평군 지평명 무왕1리. 이곳은 산악지역의 좁은 지형으로 농지가 별로 없는 산골마을인 데다 마을 꼭대기에는 양평군 쓰레기 매립장까지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군에서 나오는 환경부담금과 콩, 보리농사, 약간의 논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마을 이장인 김기남 씨는 지난해 1월 마을 분위기 쇄신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강소농민간전문가 이상필 전문위원을 찾았다. 이 위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도내 마을의 소득사업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기남 이장으로부터 사연을 들은 이 위원은 해바라기 농사를 권했고, 김 이장 역시 전부터 생각해왔던 바라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문제는 무왕1리에는 해바라기 열매를 가공할 만한 시설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 위원은 수소문 끝에 제주도에 위치한 한 해바라기 가공업체를 무왕1리와 연계해 줬고,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해바라기 열매를 전량 해당 가공업체에 납품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됐다.
첫해 무왕1리에 거주하는 80여 가구 중 10가구가 49,500㎡(15,000평) 규모의 해바라기 농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농사에 참여한 가구 평균 2,500원(3.3㎡)의 평균 순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도작(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 것) 평균 순소득 1,300원(3.3㎡)의 두 배 가까운 소득 인데다 2천원이 안 되는 벼농사보다도 소득이 최대 92%까지 올라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양평 해바라기마을에는 올해 20가구가 참여해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115,500㎡(35,000평) 면적에 해바라기 농사를 짓고 있다.
해바라기 농사는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관광객 증가라는 선물도 가져왔다.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꽃이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루면서, 여름과 초가을까지 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원래 마을에 거주하던 미술가와 조각가, 도예가 등이 합세하며 볼거리를 만들어 갔다. 예술가들은 마을 곳곳에 목탄 작품과 조각 작품을 설치했으며 각 예술가들의 전시실과 작품실도 관광코스가 됐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양평의 오지마을이 연간 1천여 명이 넘게 찾는 관광명소가 된 것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과 해바라기 밭의 장관, 농촌 먹거리, 예술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다.”라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원을 찾은 주민들의 희망과 농업기술원의 맞춤형 지원이 함께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해바라기마을처럼 우리 마을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시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담당팀을 통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강소농민간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바라기마을의 경이로운 경관은 9월 중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