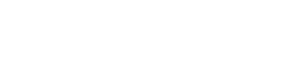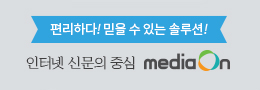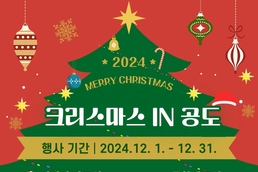수도권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국산 과일은 ‘사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소비자 1,000가구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국산 생과용 신선과일 구매행동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사과, 감귤, 포도, 복숭아, 감, 배 순으로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가구당 구매액은 사과 8만8,235원, 감귤 6만8,589원, 포도 6만1,094원, 복숭아 3만7,280원, 배 2만6,681원 순이었다.
과일 구매와 소비는 가구의 연령층, 주부의 취업여부와 같은 가구 특성과 과일의 저장기간, 추석과 설과 같은 명절소비에 따라 과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연중 저장이 가능하여 연중 소비가 되는 품목이나 특히 추석이 낀 9월과 설이 있는 1월에 전체 구매액의 28.9%로 가장 많이 소비됐다. 또한 주부 연령이 높은 가구일수록 구입액이 증가하여 30대 이하의 젊은 주부가 연간 5만6,144원을 구입하는데 비해 60세 이상 주부가 있는 가구는 13만2,584원을 사과 구입에 사용했다.
배도 명절소비가 가장 큰 과일이다. 배는 작년의 경우 총 구매액 2만7,534원 가운데 59%가 1월(8,377원)과 9월(7,985원)에 집중됐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입액이 많아져 30대 이하의 구매액 1만4,253원에 비해 60대 이상은 3만3,132원을 배 구입에 사용했다. 단 주부의 전업, 취업 여부와 구매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포도는 국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작목이다. 포도 재배면적은 2000년 2만9,200ha에서 2014년 1만6,348ha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47만5,594톤에서 26만8,556톤으로 감소했다. 작년 가구당 포도 구입액은 5만3,937원이었다. 포도는 저장이 어려워 수확 즉시 출하되므로 수확기인 8∼9월에 연간 구매액의 52%가 소비됐다.
소비자가 구입한 포도를 품종별로 살펴보면 캠벨얼리 57%, 거봉 12%, 청포도 8%, 머루포도 6%, 적포도 5.2%의 순으로 캠벨얼리와 머루포도의 구입액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수입산인 청포도, 적포도의 구입액이 증가했다. 포도는 가구 소득수준보다 포도 가격이 구입액과 구입횟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편, 칠레산 포도의 연간구입액이 2010년 2,939원에서 2014년 3,470원으로 증가해 젊은층의 수입산 포도 선호도를 반영했다.
복숭아는 해마다 꾸준히 구매액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도 가구당 구매액은 3만4,418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4만2,193원으로 늘었다. 연간 구입횟수도 3.4회에서 3.9회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주부가 2만8,924원, 40대 이상 주부가 3만9,868원을 지출했다.
감귤은 해마다 구매액이 거의 일정한 과일로 소비자 가구당 연간 8.2회를 구매했다.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체 구매의 51%가 이루어졌으며 연령계층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르게 선호되고 있다.
감도 해마다 구매액이 거의 일정한 과일이며 소비자 가구당 연간 5.3회를 구매했다. 감도 수확시기인 10월과 11월에 구매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시기에 전체의 53%가 구매됐다. 30, 40대 계층의 연간 구입액 2만4,964원 보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4만8,320원으로 구입이 많았다.